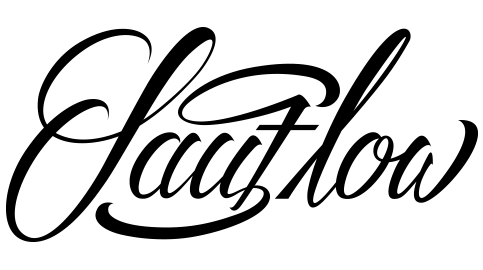연합뉴스
[모션그래픽] “자유로운 그림과 꿈”…낙서, 그 이상 그라피티
(서울=연합뉴스) “더 즐겁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제이 플로우(본명 임동주)의 말이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설지만 사실 그는 국내 최상급 그라피티 아티스트다.
그라피티는 1960년대 후반 길거리에 남은 스프레이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예술 형태다. 애초에는 반항적 청소년들과 흑인, 푸에르토리코인 등이 주도하는 B급 문화의 하나였으나 장 미셸 바스키아나 키스 해링 같은 예술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현대 예술의 한 장르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제이 플로우는 그라피티가 한국에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1년부터 거리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재미 삼아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했던 재미가 생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될지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게 늘 그렇듯,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취미는 직업이 됐다. 그리고 철없이 그림을 그리고, 족구를 했던 군대 친구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예술적 동지가 됐다. 그와 함께 JNJ 크루에서 함께 활동하는 알타임죠는 그의 군대 친구다.
새로운 예술을 시도한 건 무척이나 고된 일이었다. 그라피티도 그랬다. 그는 그라피티를 그릴 수 있는 벽이 없어 옥상에 합판을 세워두고 그림을 그린 후 지우는 것을 반복하며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생계에 대한 걱정이었다.
“사실 한국에서 그라피티를 오래 할 수 있는 조건은 참 까다로워요. 외국에서는 취미나 동호회로 그라피티를 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그라피티를 계속하려면 이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막막한 생계 걱정을 일단 뒤로 한 채 그는 스프레이를 계속 잡았다. 신생 예술인 그라피티의 ‘핫’한 이미지가 예술계와 광고업계에서 주목받으면서 그의 진가도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에르메스, 나이키 등이 주최하는 굵직한 전시회에 참가했고, 콘서트, 앨범 디자인 등에도 참가했다. 서태지 빅 콘서트, 빅뱅 1집 앨범 디자인, 리복 광고 등 상업적인 색채가 짙은 영역에서도 활동하며 이목을 끌었다. 살림살이는 조금씩 나아졌다.
“그라피티는 단순한 낙서행위에서 시작된 예술이지만 지금은 낙서에서 그치지 않고 갤러리나 여러 상업적인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그는 앞으로도 꾸준히 그라피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다. 이제는 순수하게 그라피티 자체를 즐기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업적으로만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했다.
“다른 일을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그라피티에요. 이제 그라피티는 제 아이덴티티가 됐어요. 주민등록증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누군지 확인받을 수 있는 게 저한테는 그라피티예요.” (웃음)
영상제작/박성은 기자·김민선(촬영·편집), 이덕연(촬영), 이한나(디자인) 배소담(모션) 인턴기자
jun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09 07:00 송고